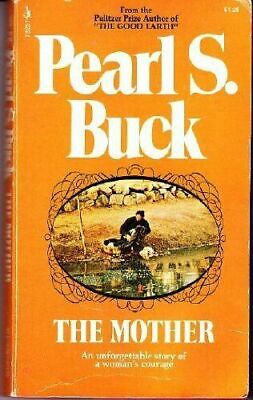
내내 답답했다.
여전히 그렇다.
무책임한 남편이
무능한 신이
원망됐다.
독자의 늪에 빠졌다.
타자의 팔자에 안도했다.
깨달았다.
이들은 이름이 없다.
그저
남편, 시어머니,
어머니,
큰아들,
딸,
막내아들,
며느리.......
호칭뿐이다.
그래, 나다.
내 가족이다.
우리엄마.
우리형
우리누나
울막내.....
독자의 늪에서
타자의 팔자에서
빠져 나온다.
우리가족
우리네 삶
나,
그리고 사랑.
'책 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읽기에도 맛이 있다 (0) | 2022.05.07 |
|---|---|
| [기드 모파상] 어느 인생 (여자의 일생) (0) | 2022.04.30 |
| [가와바타 야스나리] 설국 (0) | 2022.04.17 |
| [박완서] 포말의 집 (0) | 2022.04.10 |
| [미우라 아야코] 양치는 언덕 (0) | 2022.04.10 |



